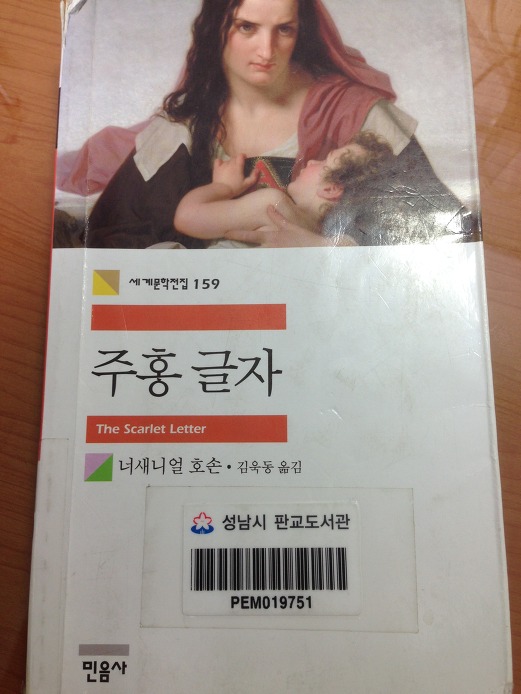리뷰 - 주홍글씨
한창 세상을 떠들게 했던 고인 이은주씨. 그 때 주홍 글씨라는 영화 제목을 처음 보고 호기심 가득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어렸던 나에게 고인의 영화를 본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으스스하기도 했고 청소년 관람 불가이기도 해서 그냥 마음만 안타까워 하며 지나간 기억이 있다. 그렇게 수 년이 지나고 어느 사이트에선가, 주홍 글씨라는 영화의 제목이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라는 식의 네티즌의 댓글을 보았다. 아마 그 때였던 것 같다, 내 머릿속 어딘가 깊숙히 주홍 글자가 새겨진 때가. 지난 주 도서관에서 세계 문학 전집을 훑어내리다 내 눈은 주홍 글자에 그대로 꽂혀 버렸다. 그리고 그 때의 호기심이 그 책을 뽑아들었다. 상당한 두깨의 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화두는 바람이다. 한 여인이 바람을 피었다. 그것도 나이 지긋히 든 남편을 버리고 젊고 잘생기고 능력있는 목사님을 유혹해서 바람을 폈다. 불행히도 이 여인에게 아이가 생겼고 동네에 부정한 여자로 소문이 퍼진다. 엄격한 청교도의 마을에서 그런 소문이 돌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난 것이다. 그녀에게는 여자로써 받을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이자 치욕이 내려졌다. 그게 바로 그녀의 가슴에 수놓아진 치욕의 징표, 간음(Adultery)을 상징하는 주홍색 글자, ‘A’이다. 그녀는 그 글자를 달고, 온 마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공개 처형대에서 수모를 당했고, 그리고 그 수모를 평생동안 가슴에 지닌 채 살아가야 했다. 이 책은 그냥 그런, 바람핀 여인이 치르는 죗값에 대한 이야기이다.
만약 나의 이마에 거짓말쟁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고, 이를 평생동안 드러내놓고 다녀야 한다면 어떨까? 아마 나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들을 일단 의심하고 볼 것이다. 나중에 자기들끼리 모이면 뒤에서 수군대면서 어제 무슨 말을 하던데 다 뻥인것 같더라는 식의 이야기도 할 것이다. 처음 보는 사람도 나를 잘 알지 못하면서 내 이마의 낙인을 보고 나면 행여나 자신에게 사기를 치려는 것은 아닌지 말씨 하나 하나를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들을 것이다. 그렇게 의심에 사로 잡혀 열심히 듣기는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닌 자신을 속이는지에만 집중하다가, 자신마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거나 이런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을 행여나 남들이 볼까 싶어 어서 자리를 뜨고 말 것이다. 낙인이란 것은 그런 것이다. 나에 대한 편견. 사실 굳이 이마가 아니어도 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너무나 쉽게 보이지 않는 낙인을 찍는다. 이 사람은 좀 당당하지 못하고 말 솜씨가 없는 것 같다는 둥, 이 사람은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둥. 그렇게 자신만의 낙인을 찍어 놓고, 그 사람을 대할 땐 어김없이 그 낙인을 바라보며 편견에 휩싸인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한다.
이 소설에서는 두 명의 서로 다른 낙인이 찍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두 사람은 같은 죄를 함께 지었지만 서로 다른 상황속에 처한다. 한 사람은 헤스터 프린으로, 위에서 말한 바람핀 여자이다. 이 사람은 가슴팍에 간음을 상징하는 글자 ‘A’를 새긴 채 평생을 살아가야 했다. 다른 한 사람은 바람의 대상이 된 딤스데일 목사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신성하고 능력있고 잘생기고 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끝내 밝혀지지 않았던 헤스터 프린의 간음의 대상이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헤스터 프린과 목사 그 자신 말고는. 이 사람이 찍힌 낙인은 수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 멋진 사람, 성공한 사람, 성자, 목사님 이다. 좋은 낙인 아닌가 싶지만, 그 모습이 자신의 실재 모습과 괴리가 있을 때 이만큼 괴로운 일도 없을 것이다.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죄인이고, 위선자고 비겁자라고 외치고 싶지만 결국 그런 타인의 기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여생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지는 이 소설의 끝에 나타나는 딤스데일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낙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냥 견디는 것, 신경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타인의 시선과 낙인에 굴복하지 말고 나만이 사색하고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굳건히 꿋꿋하게 걸어 나가야 한다. 헤스터 프린이 그랬다. 그 주홍색의 한 글자 ‘A’는 헤스터 프린을 철저히 사회로부터 고립시켰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경멸의 눈초리로 “너는 인간 쓰레기야” “창녀같으니” “더러운 것” 같은 낙인을 그녀의 가슴의 글자 ‘A’ 위에 수도 없이 덧박았고, 그 누구도 그런 그녀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 굴복하지 않았다. 어떠한 낙인이 그녀를 뒤덮어도 그녀의 자기 표현의 의지는 꺾지 못했다. 그녀는 말 없이 행동으로 그녀 자신을 표현했다. 선행하고 베풀고 나누고 봉사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7년이라는 세월동안 그녀를 뒤덮었던 낙인, 간음(Adultery)한 죄인을 상징하는 그 낙인 ‘A’가 점차 능력(Able)을 상징하는 ‘A’가 되었고, 나중엔 천사(Angel)를 상징하는 ‘A’가 되었다. 결국 그녀는 시선에 굴복하지 않았다. 되려 그 강력한 낙인의 의미를 변화시켰다.
나는 두 번째 문단에서 이 책의 화두가 바람이라고 하였다. 뜬금없지만 사실 농담이었다. 바람이 화두라기엔 낯뜨거운 씬이라도 기대하는 독자에게 어떠한 것 하나 만족 시켜 주는 부분이 없을 것이다. 난 이 책이 진정으로 던지는 화두는 타인의 시선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관한 것이라 생각된다. 서로 다른 낙인을 극복해 낸 헤스터와 딤스데일의 삶. 특히 소설 말미에 타인의 시선과 낙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위선적이고도 이중적으로 살아온 7년간의 삶보다 다시 헤스터를 만난 후 죽음 까지의 진정 나일 수 있었던 단 3일간의 시간이 더 행복했다는 딤스데일의 말은 바로 작가가 던지고자 하는 돌멩이이고, 내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사색의 물결로 오랜 여운을 남겼다.